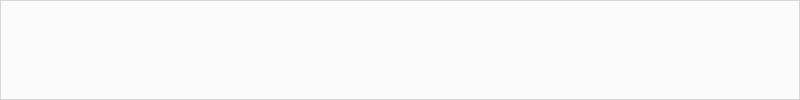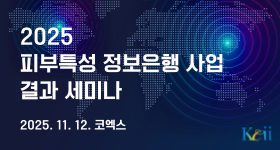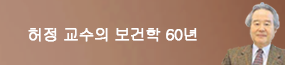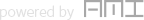한국 의약품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비해 생산 규모는 작지만, 동일 금액 투자 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네릭의약품 활성화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의약품 접근성 제고 등 공공의료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뢰로 산업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연구'를 통해 21일 발표된 결과다.
연구 보고서가 한국은행의 2020년 및 2022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약품 3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에서 의약품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산업별로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의약품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22년 한국은행 계수 기준 3600억원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대비 약 1.22배 많았다.
고용유발효과는 2,055명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의 2.6배, 디스플레이 산업의 1.26배나 높은 수치로, 의약품산업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보고서는 제네릭의약품의 사회후생적 기여도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사례 분석 결과, 제네릭 출시 이후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되고 제네릭 사용이 확산되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283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제네릭의약품 공급 확대는 독감 유행기에 국민의 진료 접근성과 치료 기회를 증대시키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의료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국내 개발 신약(케이캡, 펙수클루, 자큐보 등)이 등장한 소화성궤양 치료제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처방 금액이 1백만 원 증가할 때 관련 병원 방문 일수와 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 이용 수요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후생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백신 시장에서도 자국민 건강 증진과 국제 공중보건 개선에 기여한 성과가 확인됐다. 국내 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자급률은 2019년 52.8%에서 2023년 63.6%로 증가하며 수입 의존도를 낮췄다. GC녹십자, 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WHO PQ 인증 및 국제 조달시장 진출을 통해 국제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다만, 22개 예방접종 백신 중 11개는 여전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공공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희귀난치병 치료제, 원료의약품 등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나 우대제도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